향기가 나는 그림이 있다. 천세련 작가의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처음 그녀의 작품을 만난 때는 2004년 여름이었다.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 파크 멀티미디어센터 갤러리에서 열린 ‘차의 마음’이란 전시에서였다.
모든 그림은 작가의 마음을 담는 것일 텐데 이 작가는 전시의 제목을 아예 ‘마음(心)’이라 정하고 마음 자체를 그림의 대상으로 삼았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양분된 작가의 마음은 전시공간을 둘로 구분하고 있었다.

한국 근대사 속에서 찾아낸 여인들의 경직된 모습을 그려낸 조선여인시리즈가 과거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 그 즈음 그녀가 새로 빠져들기 시작한 한국전통 녹차에 대한 애정을 담은 찻잔시리즈는 미래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 했다. 화면을 구성하는 달과 찻잔의 환상적 배열과 잔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의 리얼리티가 인상에 남은 전시회였다. (작품1)
두 번 째 그녀의 작품을 만난 것은 2010년 맨해튼 첼시 킵스 갤러리(Chelsea Kips gallery)에서 열린 '박수근에의 그리움(Hommage to Sookuen)'이란 전시에서였다. 장구의 양 쪽 끝에서 떼어낸 가죽 판을 캔버스로 삼고 판 위에 차를 마시고 난 후 찻물이 다 우러난 찻잎을 얹었다. 찻잎이 말라가면서 배어나는 물기가 가죽 표면에 우연한 흔적을 남기면서 자연스레 산수풍경을 그려낸다. 마른 찻잎 위에 유화물감이 덧입혀지고 반복적인 작업이 거듭된 판에선 입체적인 굴곡이 생겨나며 오래된 벽화와 같은 질감이 느껴졌다. 고인이 된 화가 박수근의 유작들에서 느낄 수 있는 화면의 질감과 물감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함으로써 단색화를 완성해가는 윤형근의 기법을 동시에 떠올리겐 한 작품들이었다. (작품2)

그녀의 전시무대가 최근 들어 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17년 수원시립미술관, 성남아트센터, 한가람 미술관 등의 전시를 거쳐 올해엔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로 예술 공간 ‘이아갤러리’ 기획초대전이 열렸다. 'Ubiquitous'란 제목의 전시(2018,5,2~5,13)였다.(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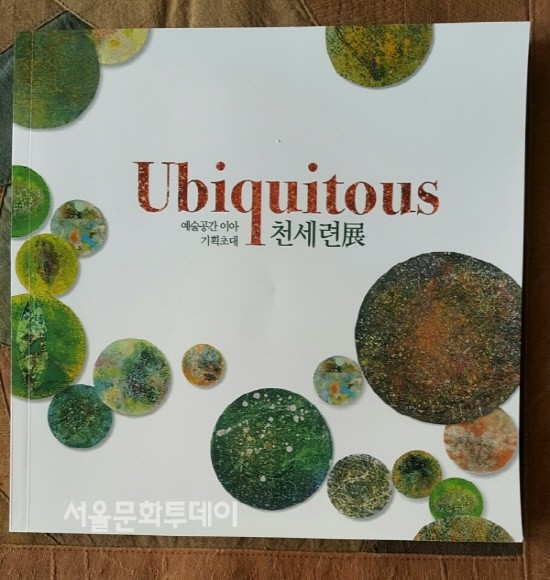
제주 전시에 연이어 수원 에 위치한 ‘대안 공간 눈’에서 기획한 ‘두리누리전’((5,17~30)에서 그녀의 작품을 다시 만났다. ‘대안 공간 눈’은 수원 화성행궁 인근의 전통마을인 행궁동에 있다. 쇠락해가는 옛집들이 밀집한 작은 골목을 예술거리로 변모시키는 도시재생사(gentrification)으로 조성된 전시장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미로같이 열리는 좁은 길을 따라 5개의 전시공간이 늘어서 있다. 맨 안쪽에 자리 잡은 ‘전시공간 봄’이 메인 전시장이다.
전시장 입구에서 보면 정면 중앙에 구슬을 주렁주렁 매단 듯한 줄 여러 개가 천정에서 내려져 있다. 줄에 매달린 하나하나의 오브제가 원형의 작은 그림이다. 매달린 그림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날 때 둥그렇게 공간을 차지한 작품이 언뜻 화려한 신라 금관을 떠올리게 한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오면 작품이 좌우로 흔들리며 춤추는 여인을 닮은 모습을 연출한다.(작품4)

춤은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말한 무용평론가 ‘월터 소렐’(Walter Sorell, 1905~1997, 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천세련의 설치작품은 조각된 춤이라고 볼 수 있다. 뒤쪽 벽에 걸린 오브제가 눈길을 끈다. 제주에서 발견했다는 오래 된 소반이다. 소반의 다리는 잘려나갔고 시간의 흔적을 뒤집어쓴 채 둥근 몸통만 남아 있다. 벽에 걸린 소반의 몸통을 하얀 실타래가 칭칭 휘감고는 아래로 내려져 벽에 고정되었다. 오래 전 그 소반을 사용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끈질긴 인연의 실을 통해 현대로 이어짐을 상징하는 듯하다.(작품5)

그녀의 갤럭시 밀키웨이(Galaxy Milky way) 작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전시장 왼 편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벽 전체가 작품의 캔버스가 된다. 원형의 크고 작은 그림들이 흐르는 물처럼, 늘어선 산맥처럼 장방형을 이루며 벽면의 끝에서 끝까지를 유영한다. 은하수를 닮은 전체의 모습에서 하나하나의 그림들은 은하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다. 지구라는 작은 별도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두터운 한지 혹은 가죽표면에 시차를 두고 수없이 찍혀지는 점들이 몇 번이고 덧 입혀지면서 작품마다 다양한 흔적을 남긴다. 실을 통해 연결되는 크고 작은 원형의 그림들과 그 유선형의 배치가 무한한 우주공간과 영원한 시간성을 떠올리게 하는 환상적인 작품이었다.(작품6)

2004년 이후 천세련의 작품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자연(自然)과 우연(偶然)과 인연(因緣)이다. 산길에서 주워든 나뭇조각, 해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돌멩이, 차를 우려내고 남은 찻잎들, 골동품가게에서 발견한 방직공장의 실타래, 장구에서 떼어낸 가죽 판 등이 모두 작품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들이다. 천연의 재료들이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는 한국적 정서와 결합함으로써 토속적인 그리움과 선가적인 자유스러움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녀는 옴(OM, ㅇ∙ㅁ)이란 말을 즐겨 쓴다. ‘ㅇ’은 하늘을 뜻하고 ‘ㅁ’은 땅을 가리킨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天圓地方)’는 인식과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다는 천지인(天地人)사상이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른다. 도는 자연이다)’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그녀의 작품들은 우연의 결과로 탄생한다. 화폭 위에 무수히 찍혀가는 점들의 행렬, 가죽 판을 물들여가는 찻물의 흔적, 벽면을 가득 채우며 무한히 확장하는 은하계의 행성들은 정해진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재료의 성질에 따라 작품이 완성되고 전시장 구조에 따라 구성이 바뀐다. 바람이 불어오면 설치된 작품은 춤을 추고 전시장 크기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된다. 모두가 우연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우연성은 추상성을 동반하고 추상성은 스토리텔링을 요구한다. 천세련의 작품을 개념미술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연과 우연을 연결하는 것을 천세련은 인연이라고 본다. 우연이 우연으로 연결될 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이를 운명이라거나 인연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에 의해 의도된 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천세련은 인연을 실로 은유한다. 그가 찍은 점들, 곧 물체와 사건들은 실 즉, 인연 줄로 연결된다. 작품과 작품들이 실로 연결될 때 공간은 확장되고 시간은 연장된다. 당의 현종이 장한가(長恨歌)에서 노래한 연리지(連理枝) 비익조(比翼鳥)의 개념의 그녀에겐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천세련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자리를 옮긴 재미화가다. 건국대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신정여상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의사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정착한 때가 1982년이다. 뉴욕대학에서 판화를 공부하고 두 딸을 낳아 성장시키는 데 그녀는 30대와 40대를 보냈다.
화가의 일상은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식 108배를 하고 정좌하고 차를 마신다. 휴일엔 산행을 하고 남는 시간은 작업에 몰입한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이 주는 감각을 내면에 받아들이고 켜켜이 쌓인 내면의 진실을 자유롭게 표출해낸다. 차가 풍겨내는 순향(純香)처럼 예술가의 작품은 그 자신의 삶과 일치할 때 진정한 향기를 풍긴다. 그녀의 작품에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이 없다면 예술은 다만 고통스러운 직업에 불과할 뿐이겠지요. 그림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 위안을 느낀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자연과 우연과 인연으로 짜여 지는 천세련의 예술세계, 그의 작품이 풍겨내는 순수한 향기가 차향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감싸 안으며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