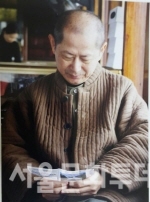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직업마다 붙여진 접미어를 보면 일의 성격이 대충 드러난다. 명인, 도인, 성인 등과 같이 사람 인(人)자가 붙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교육자, 성직자, 기자 등에겐 놈 자(者)가 붙고 의사, 목사에겐 스승 사(師)자가 붙는다. 판검사에겐 일 사(事)자가 붙는데 변호사와 회계사엔 선비 사(士)자를 붙인다. 지아비 부(夫)가 붙는 직업, 손 수(手)자가 따르는 직업, 장인 공(工)자가 붙는 직업도 있다. 소설가, 화가, 작곡가, 안무가 등 예술가에겐 집‘가(家)’자가 붙는다. 특별한 재능은 타고 났으되 돈과는 거리가 멀고 불특정 다수의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하는 것이 예술가직업의 특성일 것이다. 평론가에게도 똑 같은 접미어가 붙어 있다. 오랜 시간 예술과 함께 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존중과 신망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평판을 잃고 추락하는 명칭도 있다. 본래의 고유한 가치를 잃고 사회에서의 순수한 기능이 쇠퇴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일 터인데 평론가도 그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론가는 예술작품을 보고 전문적 안목으로 가치를 평가한 후 문자의 형식을 빌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직업이다. 평론가의 전문성이나 평가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를 알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달방식의 기본 중 기본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시퀀스별로 강약의 완급 속에서 일상성을 구현하고, 의식의 표현은 리듬의 패턴을 가진 운동을 통해 내면의 주관성으로 익숙한 심미성을 그려내려”
“무대에서 구현된 공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관객이 해석한 상상적 지평의 변화 속에서 의미가 소통적 조화를 이루며 구현되고”
“심리적 현실성을 상징적 상상력을 통해 표출하는 등 의미의 위상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
“짧은 시퀀스들이 분절되어 있지만 일정서사구조 속에서 매듭과 풀림을 두고, 사물의 장단 속에서 난장의 집단적 움직임이 엑스터시를 이끄는”
어느 무용 전문지 최근의 공연 평에 실린 글 중 일부를 발췌해 본 것이다. 무용보기와 글쓰기를 본업으로 삼는 필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한 개념들이 집합된 문장 들이다. 이러한 글들이 작품에 대한 리뷰로서 활자화될 때 어느 무용가나 관객 혹은 독자들이 이해하고 도움 되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정제적 해석’이란 낯선 제목이 붙은 평론도 읽었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평론가가 붙인 이러한 제목은 난감하다. 제목이 낯설다면 영어나 한자를 병기하던지 본문에 설명이라도 있어야할 텐데 어디에도 그러한 친절함은 보이지 않았다.
특정한 평론가나 무용전문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글들이 무용평론이란 이름으로 매달 전문지를 장식할 때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실망한 독자들은 평론을 읽지 않고 평론가는 무시될 것이다. 평론의 고유한 가치는 상실되고 예술을 위한 평론의 순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평론가의 자부심도 사라져가고 있다. 평론가에 붙여진 ‘가(家)’자를 어떤 접미어가 대신하게 될까. 평론가들과 무용전문지에 호소하고 싶다. 평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평론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작품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겸손한 언어로 작가와 관객, 독자들과 소통해야한다. 평론기능을 회복시키고 평론가를 존재케 하며 무용전문지를 살리는 것은 이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